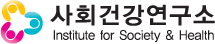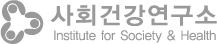2017.12.15. 오마이뉴스. 일하다 죽은 중국인, 죽어서도 부름 받지 못한 이름 [서평]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활동가들의 생애사 <결국 사람을 위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8-04-25 16:15 조회 2,587회관련링크
본문
1777. 이것은 숫자다. 1777명. 이만큼의 사람이 어떻다는 숫자다. 어떤 숫자일까. 숫자 자체로는 별 호기심이 일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 90,656. 앞서의 숫자보다 51배 커졌으니 호기심도 그만큼 커질까. '명서동 중국인', 이건 어떤가.
1777명은 2016년도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이다.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들어 죽은 사람들의 숫자이다. 90,656명은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이 된 산업재해자수이다. 1,777의 숫자는 매일 5명 정도가 산업재해로 죽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숫자일 뿐이다. 객관적 자료로써 상태를 드러낸다는 통계의 어원처럼 그저 상태를 드러낸다는 수많은 통계들 중의 하나이다.
그해 봄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한 청년 노동자가 죽었다. 그 청년의 죽음은 많은 이들에게 단지 1,777중의 1이 아니었다. 90,656명 중에는 메탄올 중독으로 실명한 6명의 청년 노동자들도 있었다.
명서동 중국인. 리당청씨는 일하다 죽었다. '명서동 중국인'은 2012년 1,864명의 산재사망자 중 하나이다. 그의 주검은 과로사로 밝혀지기까지 한 달 넘게 병원 시신 보관 장소에 있었다. 2012년 7월, 마산창원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집행위원인 이은주씨가 리당청씨의 부인과 영안실을 찾았다.
"냉동고 입구에 '명서동 중국인'이라 쓰여 있는 거에요. 이 사회는 정말 (어이없는 웃음), 이미 와서 가족이 시신 확인을 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예의잖아요."
이은주, 그녀는 "죽어서야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22년간 한반도의 남쪽에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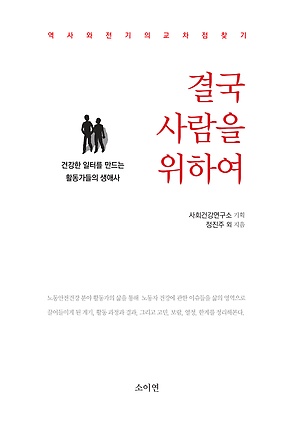 | |
| ▲ <결국 사람을 위하여>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활동가들의 생애사 | |
| ⓒ 소이연 | |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활동가들의 생애사'라는 부제가 붙은 <결국 사람을 위하여>는 이은주와 같은 네 사람의 활동가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역사와 전기의 교차점 찾기'라는 설명처럼 이들이 살아온 삶과 그 무대인 한국의 노동환경 역사를 씨줄, 날줄로 베 짜듯 엮어내었다. 네 사람의 이야기는 1,864명, 1,777명과 같은 통계를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로 그려낸다.
이 책의 30쪽 정도까지 읽었을 때 가슴이 뻐근하였다. 첫 번째 주인공 김신범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고작 두 번째 쪽이었다. '죽은 아버지 대신 채용된 친구'라는 이야기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중학교 2학년 때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말하자면 산업재해였어요. 그때 가족하고 합의를 했는데, 가족 중의 한 명을 대신 채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어요. 그 가정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지요. 그런데 그 집안의 장남이 누구였나 하면 제 친구였어요. 이제 중학생인. 학교 그만두고 아버지 대신 화물 일을 하러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일이 정말 슬픈 일로 기억에 남아요."
아버지를 여의고 졸지에 가장이 되어 학교를 떠나는 축 처진 어깨의 열세 살 소년. 그 쓸쓸한 뒷모습을 봐야 했을 또 다른 열세 살 소년. 그 모습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려졌다. 1984년쯤이었을 그 시대와 어울리지 않을 법해서 더 가슴이 아렸다. 친구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는 예민하였던 것이다.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를 쓴 스탠리 코언은 저 심각한 책을 그의 어린 시절 일화부터 시작하였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늘 너무 예민하다고 말씀하셨다.", "그 불편한 심정은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느낌에서 비롯했지만....."
1970년 가난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김신범, 1968년 광산마을 태백 출생 박세민, 대통령이 떠났다며 통곡했다던(나도 그랬다) 1968년생 이은주, 1960년 서울 출생 이훈구. 노동안전건강 분야 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온 이 네 사람은 모두 그 삶의 시작이 '예민함'에 있었던 것 같다.
그 '예민함'을 누군가는 "아, 내가 공부를 한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이어갔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네 사람이 걸어 온 삶의 여정은 분명 달랐다. 그러나, 2015년 금속가공유 저감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200리터들이 드럼통 오천 개 정도를 줄인 활동과 같이 두 명의 서로 다른 활동가의 생애사에서 겹쳐지듯 비슷하기도 하였다.
나는 책 속 주인공들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다. 동시대인이어서, 그리고 이들처럼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직업인으로서 살아오기도 해서 이들의 생애사는 나에겐 더 입체적이었다. 의사들은 통상 양적 연구 방법에 익숙하다. 십 수 년 전 다학제간 연구모임에서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것을 접하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이 책은 서문에서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생애사를 통해 사회구조를 재구성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생애사를 채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그 의도대로 적절하게 서사를 풀어냈다. 그러나, 화자인 활동가나 생애사를 기록한 기록자에 따라서 매끈함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살짝 아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약 100여 년 전 미국에는 '라듐 아씨들(The Radium Girls)'이 있었다. 밤에도 시계를 볼 수 있게 시계판의 숫자와 시침, 분침에 야광물질을 칠했던 여성노동자들이었다. 붓으로 야광물질을 묻혀 칠하고 입술로 뭉툭해진 붓 끝을 다듬었다. 그 야광물질에 함유된 라듐 때문에 병들고 죽어갔다. 이들의 죽음은 그저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노동자 권리에 관한 법적 판례들 중 하나가 되었다.
침대에 누워 죽어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증언하였던 라듐 아씨 캐서린 도노휴, 이들의 고통이 라듐 중독때문이었음을 밝힌 의사 마트랜드, 기꺼이 프로 보노로 일해준 변호사 그로스만 덕분이었다.
라듐 아씨들을 일일이 인터뷰하고 기록하여 지난해 책으로 엮어 낸 저자 케이트 무어는 '숲을 위해 서있는 나무를 본다'고 하였다. 그녀의 서사의 중심에는 항상 라듐 아씨들 개개인이 있었다. <결국 사람을 위하여> 이 책의 서사에서 나는 '숲을 위해 서있는 나무들'을 보았고, '숲과 나무'를 위해 애써온 사람들을 보았다.
이 책을 기획한 곳은 사회건강연구소로 대학과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연구와 교육을 시도하는 소규모 연구소이다. 몸, 마음, 사회의 건강에 대해 다학제적 차원에서 연구·교육하며, 젠더 관점을 특히 강조하는 연구소의 활동은 대부분 후원금으로 이루어진다. 좋은 뜻을 갖고 활동하는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후원해주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하기를 당부해본다.